멈추지 않는 실행이 쌓아 올린 성장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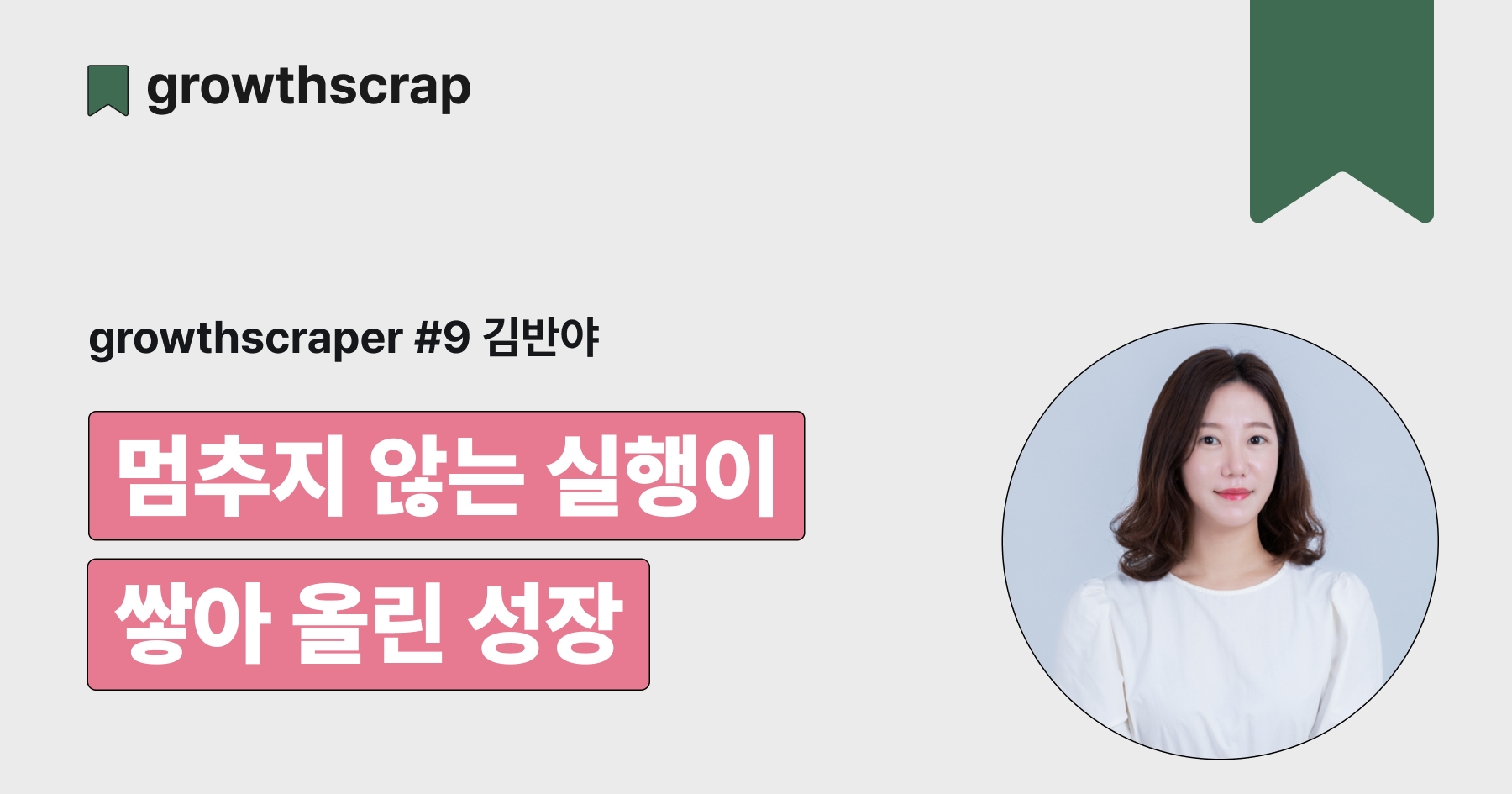
대기업과 스타트업, 그리고 여러 직무를 넘나들며 커리어를 쌓아온 김반야 님을 만났습니다. '움직이는 한, 모든 경험이 자산이 된다'라는 믿음으로 멈추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며, 각 시기의 경험을 스톤처럼 차곡차곡 모아 자신만의 커리어를 완성해 가고 있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.
🌳 안녕하세요, 김반야입니다. 다양한 산업과 직무를 거치며 '본질에 집중하는 실행력'을 키워온 콘텐츠 마케터입니다. 현재 카카오스타일에서 콘텐츠 마케팅팀을 리드하며, 유저가 브랜드를 더 깊이 좋아하게 만드는 경험을 설계하고 있습니다.
Scrap1: "제가 생각하는 일 잘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'결단력'이에요"
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?
카카오스타일에서 콘텐츠 마케팅팀을 리드하고 있습니다. 저희 팀은 회사의 대표 서비스인 스타일 커머스 플랫폼 '지그재그(Zigzag)'의 온드 미디어 채널을 담당하며, 유저들이 지그재그라는 브랜드를 더 많이 떠올리고 좋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요. 그 과정에서 유저들의 정성적인 반응과 정량적인 지표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.
